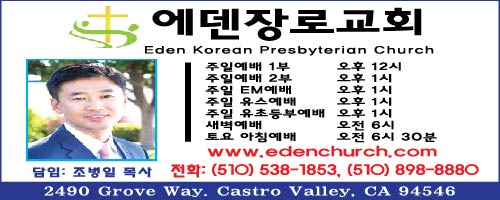난 요즘 에스토니아 출신 아르보 패르트(Arvo Part)가 작곡한 ‘슈피겔 임 슈피겔(Spiegel im Spiegel)’이란 음악에 빠져있다.
제목은 ‘거울속의 거울’이란 뜻이다.
나와 음악적 취향이 비슷한 아들의 차를 타고 가다 우연히 듣고 나서부터 좋아지게 되었다.
명상곡이다.
음악이 없으면 죽고 못 산다고 엄살떠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르를 초월하여 두루두루 좋아하는 편이다.
한국의 ‘알리’란 가수의 노래를 듣고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저런 가수가 있었다니! 지금도 오페라 ‘캐츠’에 나오는 그리자벨라가 부르는 ‘메모리’나 영화 레미제라블에서 앤 해서웨이가 부르는 ‘I Dreamed a Dream’과 같은 노래도 좋아한다.
‘The Water is Wide’도 즐겨듣지만 한국노래 ‘청산에 살리라’는 또 얼마나 좋은가? 두루두루 좋아하니 ‘잡식성’음악애호가라고 해야 하나?
요즘엔 그 알량한 저작권 때문에 음악도 함부로 내려 받지 못하고 그냥 유튜브에서 찾아 듣는게 고작이다.
옛날엔 좋아하는 애창곡을 CD에 카피하여 여기저기 인심좋게 유통되던 때가 있었건만 그것도 미국헌법위배사항이 되어 해적판 CD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런데 우리 주변엔 그런 해적판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격조 있는 ‘생음악’이 흔하게 깔려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생음악과 가까워지며 살아보겠다는 다짐을 했다.
지난주 남가주 연세콰이어 정기연주회를 참석하고 그런 다짐을 한 것이다.
고만고만한 수준에 고만고만한 노래들이겠지 생각하고 체면치레로 참석한 자리였다. 그런데 남모르는 감동이 밀려오는 게 아닌가?
초청가수 테너 이성은 씨가 김연준의 ‘청산에 살리라’에서부터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흐르는 눈물’, 앵콜 요청을 받고 불러준 ‘오 솔레미오’, ‘유 레이즈미 업’ 등 주옥같은 노래들이 울려 퍼지자 관객들은 숨을 죽이며 노래 속에 빠져드는 듯 했다. 나도 그랬다.
며칠 전 진정우 씨가 지휘하는 나성서울코랄 제72회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하이든, 모짤트, 베르디의 음악들이 무대에 올려졌다.
72회씩이나 정기 연주회가 열렸건만 나 같은 사람은 범접해선 안 되는 곳인 줄 알고 무심코 지나치며 살아왔다. 그냥 무관심이었다.
우리 한인커뮤니티에 합창단이 너무 많다느니, 실력 없는 사람들이 너무 설친다는 등 부정적인 말들이 오갈 때마다 나는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편이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잘못이었다. 합창단이 많아서 나쁠 게 없다.
실력 있는 음악가는 날 때부터 실력을 갖고 태어나는가?
모든 합창단은 나름대로 실력을 연마하고 매주 모여 갈고 닦은 노래들을 무대에 올리는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곤 한다.
그런 연주회가 많아질수록 이민사회 문화적 수준은 당연히 업그레이드 될 것이 아닌가?
포스터를 붙이고 초대권을 인쇄해서 돌려 대도 본 척 만 척하는 행위는 음악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게 예의가 아니다.
사실 어디 가서 모짤트나 하이든과 같은 명곡들을 공짜로 들을 수 있단 말인가?
입장료를 받는 음악회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오셔만 주세요”라고 초청을 해도 별로 흥미 없다는 척 거만을 떤다.
한번 생각해 보자. 공짜로 음악을 즐기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다.
그럼 그 좋은 ‘생음악’을 고생 끝에 준비하여 무대에 올리는 날, 오라고 초대를 하면 당연히 꽃단장을 하고 찾아가 주는 것이 문화인이요, 열악한환경을 딛고 음악에 정열을 쏟는 분들에게 주는 격려의 박수가 아니겠는가?
고단하게 이민생활하면서 꽃단장하고 나설 때가 많지 않다.
물론 주일이면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니 당연히 꽃단장이다.
그러나 결혼식, 장례식 빼고는 넥타이를 매거나 이런저런 일로 사서 모았던 반지나 목걸이를 걸치는 경우가 흔치 않다.
어디서 연주회가 열린다하면 “이때다!”하고 꽃단장을 하고 나서는 것이다.
귀족이라도 된 기분으로 생음악을 즐기러 나서는 것이다.
공짜니까 마음도 가볍다.
몇 년 전 도나우 강이 흐르는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방문했을 때 한 음악회에 간 적이 있다.
음악과 낭만의 도시인답게 사람들의 표정과 매너가 황실가족인양 고상함이 넘쳐나고 있었다.
모두 요한 스트라우스의 왈츠를 추러 나온 귀족처럼 느껴졌다.
우리 한인커뮤니티의 다양한 연주회에 기를 쓰고 참석하는 극성을 부려보자.
음악과 친해지다 보면 음악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열릴 수도 있다.
독일의 괴테는 이런 말을 했다.
“음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라 말할 자격도 없다”고.
더구나 대부분의 연주회엔 성가곡 한 두곡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없다.
믿는 사람들에겐 더욱 좋은 일이다.
험하게 고생하며 살지라도 음악을 들어가며 인생의 품격을 높여 보자.
<크리스찬위클리발행인>
기획기사보기
| 747 | [조명환의 쓴소리 단소리] 우려반, 기대반...트럼프 대통령 | 2016.11.16 |
| 746 | [박종순 목사의 신앙상담] 묵념 · 국민의례, 기독교 교리에 맞는 건가요 ? | 2016.11.16 |
| 745 | [조명환의 쓴소리 단소리] 담임목사님께 사랑의 노트를 | 2016.11.09 |
| 744 | [박종순 목사의 신앙상담] 신학대선 사회 참여, 교회는 은사운동... | 2016.11.09 |
| 743 | [조명환의 쓴소리 단소리] 제1호 개신교 목사 사모님 | 2016.11.02 |
| 742 | [박종순 목사의 신앙상담] 선교사로 가야하는데 담배를 못끊겠어요 | 2016.11.02 |
| 741 | <아는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미국 "민주주의" 와 "사회정의" 의 시작과 역사적 대립구도! (상) | 2016.11.02 |
| 740 | <아는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미국안에 뿌리 내린 4가지 영적 전쟁 영역들을 회복합시다!! | 2016.10.26 |
| » | [조명환의 쓴소리 단소리] 꽃단장하고 나서는 음악회 나들이 | 2016.10.26 |
| 738 | [박종순 목사의 신앙상담] 교회 담임목사님이 너무 자주 바뀝니다 | 2016.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