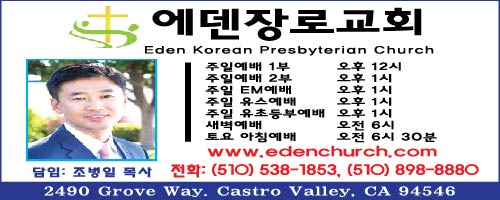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된다고 어느 모임에서 지지자들이 “노벨, 노벨”을 소리 높여 외쳤다고 한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당연하지 . . .” 그런 묘한 미소를 지으며 군중들에게 손사래를 쳤다는 기사를 읽었다.
아직 비핵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 장소도 결정되지 않은 마당인데 북한의 핵을 없애는데 크게 공헌할 것이 분명하므로 트럼프에게 노벨평화상은 따논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기류가 역력해지고 있다.
이런 경우를 보고 “줄 놈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라고 했던가.
노벨상, 특히 노벨상중에도 노벨평화상의 권위와 영예는 누구나 알고 있을 만큼 세계적으로 검증된 상에는 틀림없다.
상금도 많기는 하다.
노벨이 남긴 유산을 기금으로 노벨재단이 1년 동안 이자 장사를 해서 얻은 수입으로 상금을 주는데 매년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략 130만 달러 내외라고 한다.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이 인류에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놓은 노벨상기금은 원래 3천100만 스웨덴 크로나였다고 한다.
현재 가치로 띠지면 대략 22억6천만 달러.
그러나 상금보다는 명예다.
이걸 한번 받으면 세계적인 명사가 된다.
돈이 많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탁월한 정치가라고 받는 것도 아니다.
보통사람이라면 받을 수 없는 상이다.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던 슈바이처, 그는 이 상을 받을 만 하다.
마틴 루터 킹, 테레사 수녀, 만델라, 국경없는 의사회나 UN... 이들도 평화상을 받았다.
평화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요 인류평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는 기관이니 군소리 없이 동의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도 이 상을 받았다.
이들이 평화상을 받은 걸 갖고는 아직도 개운치 않은 군소리가 남아있다.
사실 노벨평화상을 ‘웃기는 짬뽕’이라고 놀려먹어도 되는 이유가 있다.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도 평화상 후보였기 때문이다.
결국 합격의 문턱에서 미끄러져 수상불발이 되긴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러시아의 푸틴도 후보에 올랐다는 말을 듣고 “노벨평화상은 아무나 받는 상인가보지요?”라고 기자들을 향해 뼈 있는 농담을 했다고 한다.
사실은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들어야 할 말이다.
더 웃기는 것은 영국의 윈스튼 처칠이다.
그가 평화상이 아닌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이다.
처칠이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며 유럽의 평화에 기여한 정치적 리더십을 감안한다면 평화상감이지만 그의 명령으로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인데 그에게 평화상만큼은 줄 수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래서 그가 저술한 ‘제2차 세계대전’이란 책을 꺼내들어 그에게 문학상을 수여했다니 노벨상 역사상 아직도 가장 큰 오점으로 남아있는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이 욱하는 성질을 잘 참아가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차분하게 외교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세계 평화를 위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그가 국내정치를 위해 심복들을 밥 먹듯 갈아치우는 것은 내부사정이겠거니 넘어가도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멕시코사람들을 막기 위해 장벽을 세우겠다고 우기는 일이나 국제여론은 무시한 채 이스라엘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주장해서 조용하던 중동지역에 평지풍파를 몰고 온 일이나 무슬림 입국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이슬람 국가들의 원성을 산 것 등을 따져보면 그가 과연 평화상 후보감인가 의문을 갖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를 잘 달래고 구워삶아서 만약 북한의 비핵화를 현실이 되게 할 경우 트럼프는 역사에 길이 남을 탁월한 정치가요, 협상가요, 평화주의자로 추앙을 받아야 한다.
냉전시대를 종식시킨 레이건과 고르바초프와 맞먹을 위업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아직 본론에 접근한 상태도 아닌데 서론부분에서 “노벨, 노벨”을 외치는 것은 염불에는 맘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지 않은가?
이런 마당에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은 “노벨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으면 되고 우리는 평화만 가져오면 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난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지. . . 이 말이 바로 노벨상감이다.
난 문재인 대통령을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 한마디에 그만 가슴이 뻥 뚫리고 말았다.
따지고 보면 북한 비핵화가 김정은의 정치쇼에 속아 말짱 도루목이 될지 정말 핵 없는 한반도의 봄이 올지는 두고 봐야 할 일지만 정작 회담을 열어 보기도 전에 노벨상이란 성급한 김치국부터 마시려는 게 마땅치 않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가장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사람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가?
그런데 자기는 후보가 아니라고 발을 빼는 그의 겸양의 정치력이 한반도의 명운이 걸린 5월의 격랑 속에서 너무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란 유행가가 있다.
문득 “노벨상은 아무나 받나?”란 말이 유행할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
노벨상은 아무나 받을 수는 있다.
심사에서 합격만 하면 되니까.
만약 트럼프의 협상력으로 마침내 핵이 없는 한반도, 그 목표가 성취될 경우 트럼프에겐 노벨상이 아니라 수퍼노벨상을 주어도 그의 공로를 다 치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상대인 김정은이 자신의 생명줄로 여기는 핵을 정말 포기할까? 그것이 문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것이다.
노벨상에 눈이 어두워진 트럼프 대통령이 땅속에 감춰둔 핵무기를 보고도 그냥 대충 없는 것으로 하고 비핵화가 성공을 거뒀다고 뻥을 치는 경우다.
<크리스찬 위클리 발행인>
기획기사보기
| 1007 | <광야를 지나서> (53) "공통점은 부르심이었다" (하) - 한용길 CBS 사장 | 2018.05.16 |
| 1006 | <아는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사회정의에 대한 역사속 대립구도와 크리스천들의 사명 ! (중) | 2018.05.16 |
| 1005 | [박종순 목사의 신앙상담] 비기독교인 이성과 교제해도 될까요 ? | 2018.05.16 |
| 1004 | [조명환의 쓴소리 단소리] "이스라엘 건국 70주년" | 2018.05.16 |
| 1003 | <주행한의원 권혜은 원장의 생활속 건강 이야기> (16) "예방과 재활을 생활속으로" | 2018.05.09 |
| 1002 | <광야를 지나서> (52) "공통점은 부르심이었다" (상) - 한용길 CBS 사장 | 2018.05.09 |
| 1001 | <아는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사회정의에 대한 역사속 대립구도와 크리스천들의 사명 ! (상) | 2018.05.09 |
| » | [조명환의 쓴소리 단소리] "노벨상은 아무나 받나 ?" | 2018.05.09 |
| 999 | [박종순 목사의 신앙상담] 천국 · 지옥 다녀왔다는 간증 믿어도 될까 ? | 2018.05.09 |
| 998 | <광야를 지나서> (51) "각서 쓰고 공연하다" (하) - 한용길 CBS 사장 | 2018.05.02 |